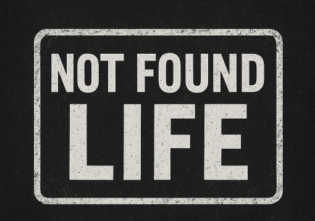트럼프의 40% 관세에도 “감사”한 미얀마 군정

2025년 7월 12일(현지 시간), 미얀마 군사정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0% 고율 관세 부과’ 서한에 대해 공식적으로 “감사하다”는 답신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는 그동안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던 군정이, 미국과의 접촉 자체를 ‘정권 인정’으로 해석하고 외교적 전환점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미국은 2021년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고, 공식적인 외교 채널도 차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이번 관세 서한에서 민 아웅 흘라잉 사령관을 직접 언급한 것을 근거로, 군정은 이를 정권의 ‘외교적 존재감 회복’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부의 ‘감사’ 표명… 정당성 집착 드러낸 반응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트럼프에게 보낸 답장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당신의 진정한 애국심과 강력한 리더십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당신이 겪었던 어려움처럼, 우리도 심각한 선거 사기와 부정행위를 겪었다”고 언급하며, 쿠데타의 정당성을 트럼프의 대선 불복 논리와 나란히 놓으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국제위기그룹(ICG)은 이번 서한을 “미국이 미얀마 군정 수장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첫 사례”로 평가하며, 군정이 이를 국제적 인정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군부는 2020년 총선에서 아웅산 수지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하자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2021년 쿠데타를 일으켰고, 지금까지 무력 통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관세 문제보다 정치적 존재감 회복에만 집착하는 군정의 태도는, 국민의 삶보다는 정권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내전 격화… 500여 명, 태국 국경 넘어 도주

한편, 미얀마 국경지대에서는 반군과 군부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렌민족해방군(KNLA)을 비롯한 소수민족 무장세력들은 카렌주 일대 군사기지와 보급로를 집중 공격하고 있으며, 카렌주 동부와 국경 지역은 현재 KNLA가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미얀마 군인 100명과 민간인 400여 명, 총 500여 명이 태국 국경을 넘어 도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태국 당국은 이들을 무장 해제 후 인도주의적 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피난이 아니라, 군 내부의 결속력 붕괴와 전열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분석됩니다.
로힝야족의 탈출, 다시 이어지는 비극

동시에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는 로힝야족에 대한 박해와 강제 이주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UN에 따르면 최근 18개월 동안 15만 명이 넘는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으며, 이는 2017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현재 방글라데시 내에는 약 130만 명 이상의 로힝야 난민이 체류하고 있으며, 그들은 폭격, 마을 방화, 식량 차단 등 미얀마 군정의 집단 탄압을 피해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부분은 콕스바자르 난민 캠프에 몰려 있으며, 의료·식량·위생 시스템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UNHCR은 “9월부터는 의료 지원이, 12월부터는 식량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국제 고립 속, 무너지는 체제의 실체
트럼프와의 서신 교환을 계기로 외교적 탈출구를 모색하려는 미얀마 군정.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국민과 군인들이 스스로 국경을 넘고, 소수민족들은 여전히 박해 속에서 떠돌고 있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정세는 단순한 외교 이슈를 넘어, 국제적 인권과 인도주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개입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겉으로는 ‘감사’를 외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무너져가는 체제의 경고음이 점점 더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